나는 비움이라는 이메일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.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린 것은 7월 9일이었다. 50일이 지났고, 나는 아직 출시를 하지 않았다. 다른 MVP는 아이디어로부터 11일만에도 출시하고 (applepie.pro), 3일만에도 출시했는데 (당신의 감정사전) 나는 왜 이번 시도에 한해서는 50일간 출시를 하지 않았을까.
MVP 코드를 짜다가 엎다가 짜다가 엎다가 또 짜고 있다.
마이크로 피보팅 - 대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작은 최적화
bium.io는 이메일이라는 엄청나게 크고 오래된 주제의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이다. 따라서 프로젝트의 scope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이 될 가능성이 컸다. 처음에는 자체 메일 서버부터 구축하고자 했다. 그래서 진짜로 메일서버를 구축했고 첫 번째 이메일을 보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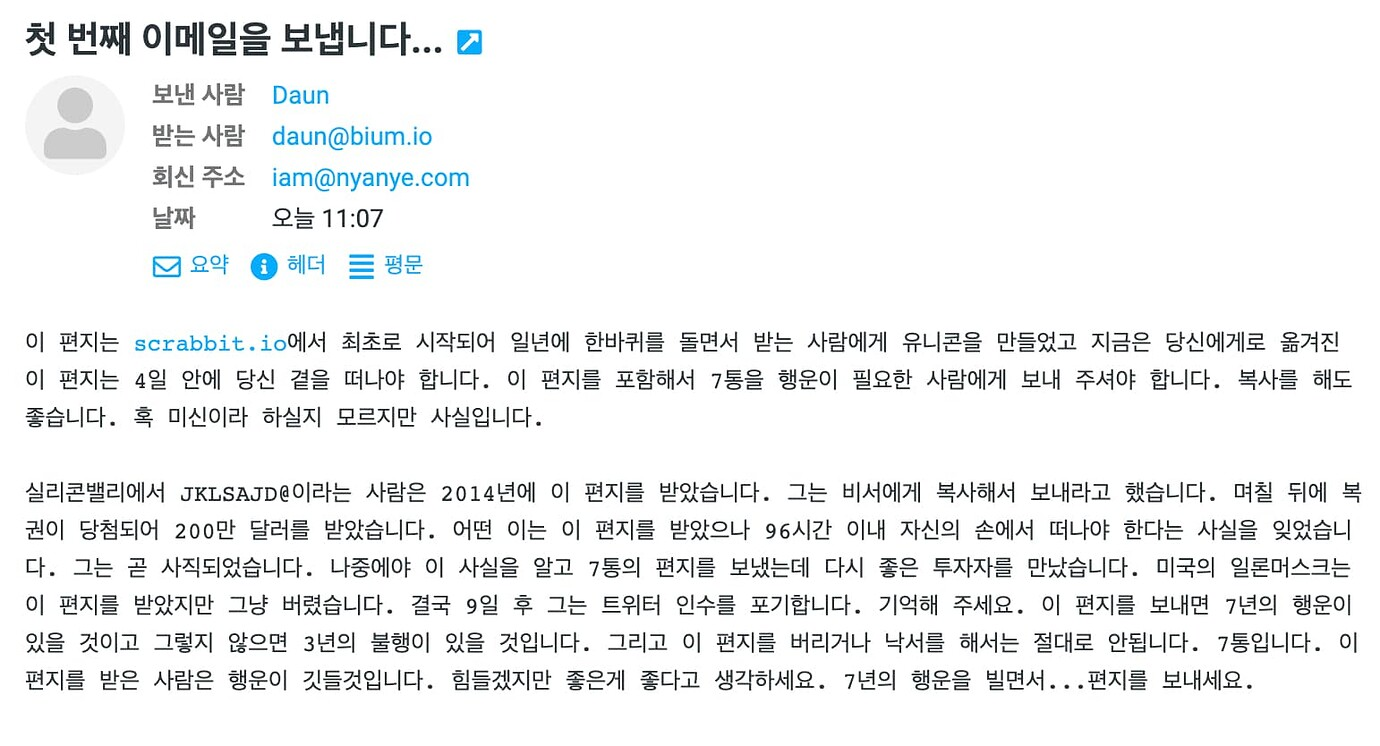
그러나 유저분들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감에 따라 ‘새로운 메일 서버’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 자체는 딱히 ‘문제’가 아니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문제를 찾아나섰고, 그에 대한 해결책을 구상하고 기획했다.
랜딩페이지를 만들었다. 여러 번 업데이트 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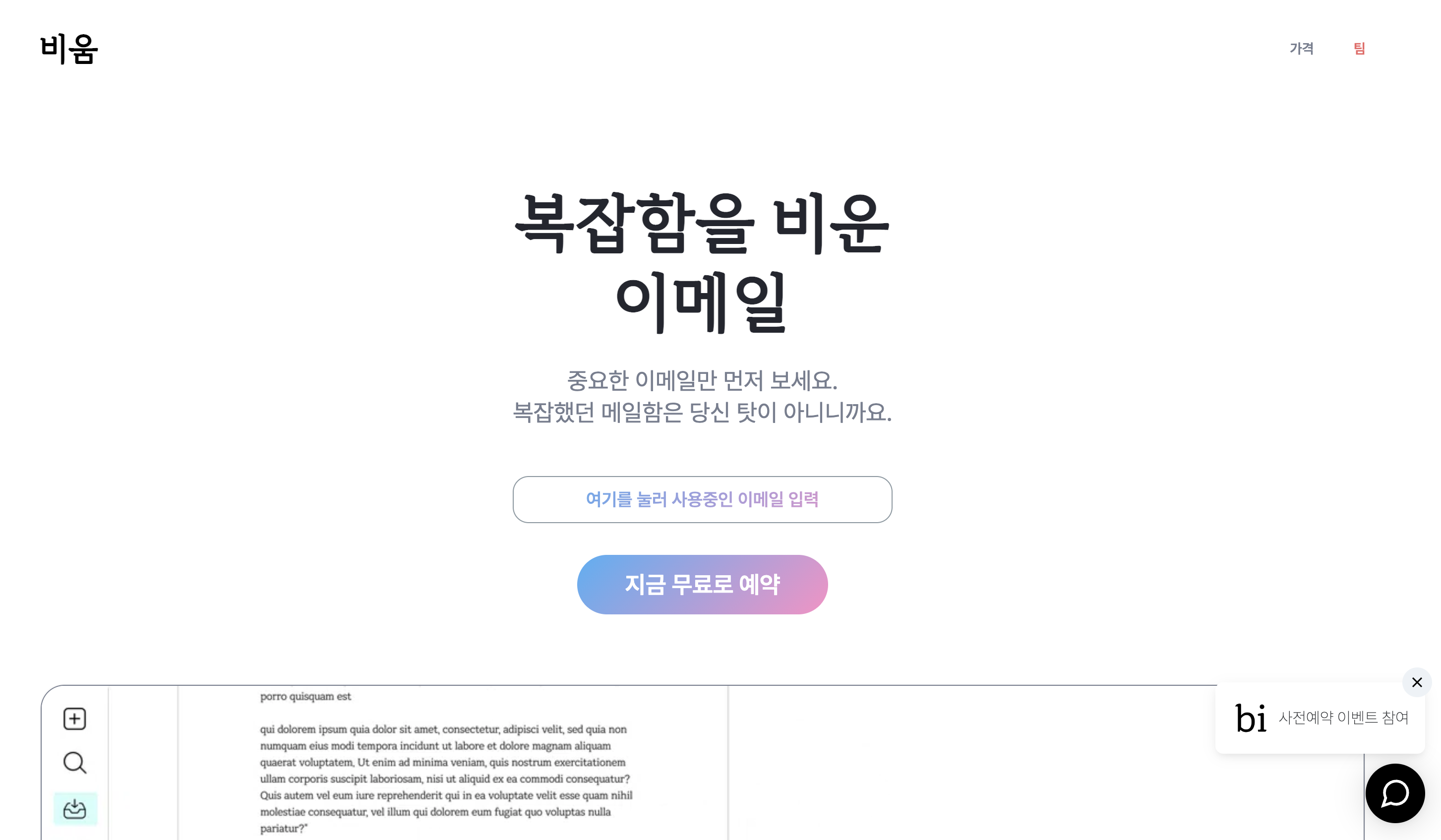
많은 주변 분들에게 들은 조언이 있었다. 그건 바로 랜딩페이지가 예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. 그러나 나는 랜딩페이지를 예쁘게 만드는 일에 좀 관심이 많았다. 왜 그랬냐면, 이 랜딩페이지에 적은 문구, 브랜드, 디자인 요소 하나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해결책을 점점 더 명확하게 가리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. 따라서,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랜딩페이지를 만들었다면, 내가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.
아는 분들도 계시고,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엄청나게 자잘한 부분들이 많이, 여러번 바뀌었다. 이는 아이디어의 근간이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작아보여도 내게는 큰 변화였다.
이밖에도 나만이 알고 있는 여러가지 MVP 코드를 짰다. 그러나 이 코드가 정말로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,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, 다른 개발자님이 오셨을 때 정상적인 코드인지, 프레임워크가 적합한지 등등 부차적인 고민을 좀 했다. 이런 고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. 다만 첫 번째 개발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미션 중 하나였기에 그 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긴 해야 했다.
유저를 먼저 만나고 가설을 검증했다.
나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성장 포인트였다. 마이크로 피보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저분들을 만났고 계속해서 가설을 검증했다.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 유저분들과 함께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했다. 정확히 몇 명을 인터뷰하고, 정확히 몇 개의 피드백을 받았는 지 자랑하지는 않겠지만 (아직도 그 숫자가 늘어나는 중이다.) 이제 적어도 비움이라는 제품에 한해서는 내가 유저분들을 좀 아는 것 같다. 그러나 여전히 훨씬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.
마음이 잘맞는 코파운더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.
비움이라는 아이템에 가면 갈수록 사랑에 빠졌고, 여러 멋진 분들에게 코파운더가 되어주시면 좋겠다는 업무적 사랑고백 (…)을 했고 여러 번 거절당했다. 내가 이런 일에 엄청나게 서툴었기 때문이었는데, 거절당하는 경험이 누적되자 괜한 반발심이라도 들었는지 남들 앞에서 뻗대는 모습도 보이고, 잘난 척도 했던 것 같다. 나는 잘나지 않았다. 그저 도전자다.
역량적인 측면보다 마음의 결이 잘맞는 분을 찾고 싶었기에 내가 많이 까탈스럽게 굴었다.
거절도 정말 여러 번 당했다.
거절을 많이 당해서인지 재촉하는 마음, 서두르는 마음도 들어서 여러 분들을 귀찮거나 피곤하게 만든 것 같았다.
이제는 진짜로 천천히 마음을 쏟아 진짜로 마음이 잘맞는 분을 찾으려 한다.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.
프론트엔드 개발 못한다는 핑계 대신, 공부를 시작했다.
비움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잘해야 한다. 천성적인 개발자다보니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편이라 프론트엔드 코드도 잘 짜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. 그러나 잘하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님은 이미 좋은 곳에서 좋은 팀원들과 함께하며 좋은 대우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비움 팀에 합류를 조르더라도 한계가 존재하는 듯 했다. 그렇지만 그 분이 오시기만 한다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그 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.
그 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멈출수는 없는 노릇이었다. 더 매력적인 제품과 비즈니스, 진짜 회사를 만들어야 설득의 도구라도 생긴다는 생각이 든다. 따라서 이제 더 이상 프론트엔드 개발을 그렇게 잘하진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지 않기로 했다. 그냥 내가 배워서라도 시작하기로 했다.
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듯 했다.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 개발을 잘하는 분 뿐만이 아니라, 비즈니스나 마케팅, 프로덕트를 잘 아시는 분이 오셔도 함께 여정을 떠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.
Key Feature를 떠올린 것은 어제였다.
풀고자 했던 문제에 대한 가장 명확한 킬러 기능을 떠올린 것은 불과 어제였다.
아이디어로부터 50일, 출시를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야 자신감을 얻었다.